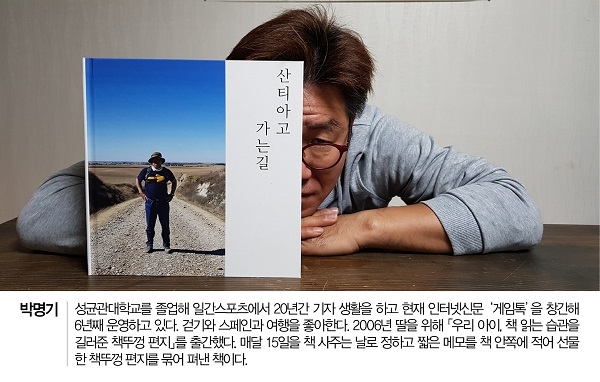“내 마음아 아직도 기억하니?”
-이성복 詩 <내 마음아 아직도 기억하니>

그녀의 이름은 묘순이다. 전주 최씨이다. 태어날 때부터 ‘묘한’ 아이였다.
그녀는 3대 독자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첫째가 딸이다 보니 집안에 난리가 났다. 가부장제가 헌법이고, 농사가 주업인 농촌에서는 '아들'은 훈장이자 벼슬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권력도 아들로부터 나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고 화가 많이 났다. 아이를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 두엄자리에 버리라고 했다. 아이는 하루가 지난 후에도 죽지 않았다. 쉬지 않고 울어댈 뿐이었다.
“묘한 아이네” 아버지는 잔기침과 함께 이 말을 남겼다. 그 울음이 아이를 살렸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이름에 '묘할묘(妙)'자가 들어갔다. 죽음의 강을 넘지 않고 환생(?)한 표식이 되었다.
드디어 남동생이 생겼지만 아버지는 딸애들한테는 한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을 했다. 이유는 “집으로 편지질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스물에 장남에다 시동생 둘, 올케 셋을 건사해야 하는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 일곱(하나는 사망)뿐 아니라 시동생들과 아들을 같이 키워야 했다.
그녀는 기가 짱짱했다. 남자가 많은 집의 위세도 작용했지만 동네 안팎에서 ‘호랑이 여장부’로 통했다. 일자무식에다 까막눈이었지만 남보다 경우를 따졌고, 공평무사했다. 그래서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원불교도였던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정화수에 떠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비롯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어떨 때는 원불교 경전의 한 대목을 외웠다. 그 염불(念佛)은 용어나 순서가 틀리기도 했다. 염불이 아닌 한글을 못 배워 순전히 외워서 하는 ‘구불(口佛)’이기 때문이었다.
********
이성복 시인은 <내 마음아 아직도 기억하니>에서 ‘개를 끌고 옥산(玉山)’에 올랐던 것을 시로 읊었다. 그리고 ‘민들레 꽃씨처럼 가볍던 그의 웃음소리’에 대해 ‘우우, 내 마음아 아직도 너는 기억하니’라고 노래했다.
그의 다른 시 <편지2>에서는 ‘오늘 아침 버스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무슨 삼줄 훑어놓은 것 같아서.../바람 부는 낯선 거리에서 짧은 편지를 씁니다’고 썼다.
********

묘한 아이 최묘순은 나의 할머니다. 종손인 나는 오랫동안 그의 할머니 무릎을 독차지했다. 숱한 날을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들딸이 다 자라 서울과 진해, 속초 등으로 생활터전이 바뀌자 그녀는 홀로 자식들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한글을 몰랐지만 그녀는 주위 젊은이들에게 수첩에 적은 번호를 찾아서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시흥집 내 신혼집에도 그렇게 찾아왔다. 어느 날 낯선 젊은이가 전화를 해왔다. “할머니 한 분이 수첩에서 이름 찾아서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는 “20년 만에 우리집에서 애기울음을 듣는구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시흥동에 살다 마포로 이사 왔고, 용산성당이 내다보이는 아파트에 내 집을 마련했다.
그때 할머니는 추가 달린 벽시계를 직접 사서 들고 왔다. 좌우로 왔다갔다 쉬지 않은 시계가 멈추면 당신을 생각하며 밥을 주라는 뜻이었을까?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일까? 90살을 앞둔 노인네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깜짝 선물이었다.
그녀는 무릎이 좋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거나, 육교를 건널 때마다 “이놈의 가이당(계단의 일본말 표현)”라고 외치곤 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는 채로 잠깐 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계단을 넘어 아들 딸, 손주집을 혼자 찾아왔다. ‘산 넘고 물 건너’ 달랑 수첩만을 들고 찾아왔다.
지난 주말 서울둘레길 5코스 사당역-석수역 구간을 걸었다. 눈부시게 푸르른 날이었다. 관악산을 둘러가는 이 길은 낙성대와 서울대 입구를 지난다. 그리고 내 신혼시절 아이들과 같이 자주 찾았던 시흥동의 사찰 ‘호압사’로 이어진다.
호압사에서 신도와 등산객에게 공짜로 주는 국수 공양을 후르륵 먹었다. 먹다 보니 대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과 아카시 향을 맡으며 산책했던 일이 흑백사진처럼 후르륵 지나갔다.
문득, 꽃대궐이 떠올랐다. 신혼시절 우리집을 찾아온 할머니는 재래식 시장에서 고추와 상추, 호박과 수세미 모종을 듬뿍 사왔다. 이후 우리집은 마법처럼 초록집으로 변했다. 나팔꽃과 봉숭아꽃과 수세미꽃은 허름한 옛날집을 꽃대궐로 바꿔주었다.
서울둘레길은 계단이 적잖이 있다. 이제 나도 “이놈의 가이당”하고 외치는 나이가 됐다. 묘한 할머니, 최묘순씨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지 벌써 10년, 내일모레 10월 20일 10주기다.
“빚은 조금이 있어야 잘 산다” “깨작깨작 먹으면 복이 날아간다” “멋 내다가 얼어 죽었다” 등 삶의 지혜가 담긴 잔소리를 했던 최묘순씨. 경우가 빠지면 어른이 된 아버지라도 뺨을 쳤던 우리 할머니.
볕이 좋고 하늘이 높은 가을날 시흥동 옛 동네를 지나서 다시 마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눈에 들어오는 똑딱똑딱 초침을 울리는 벽시계, 물끄러미 넘겨보다 핑 눈물이 돌았다. 내 할머니, 너무 그립다. ‘내 마음아~ 너는 기억하니? 나의 할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