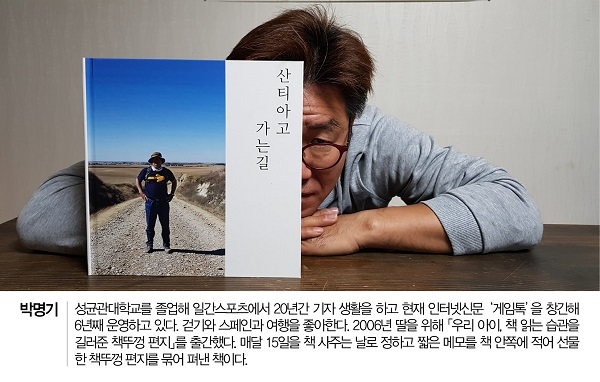“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조세희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내가 아는 한 스승은 좋은 책에 대해 이렇게 일러줬다. 읽다가 멈추어서 많은 생각에 잠기는 책, 책장을 덮고 나서도 어떤 문장이 자꾸 떠오는 책,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작가에게 직접 묻고 싶은 책, 그리고 작가를 만나서 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책이 좋은 책이라고.
가령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의 문장에는 형용사가 없다. 호흡이 짧은 대신 명료하다. 활시위처럼 팽팽하고 꼿꼿하고 날카롭다. 접속사와 수식어가 없다. 하지만 시적이다. 단어와 문장 사이에 순수한 공백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멈춘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였다.” 소설의 첫 문장이 목에 턱 걸렸다. 그리고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 대목에서 또 걸렸다.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상상했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는 어떤 모습일까. 최후의 시장은 어딜까? 소설 속 기타는 더 이상 다시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다. 줄 끊어진 기타를 치는 난장이의 막내 딸 영희가 보고 싶었다.
*********
내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는 창문 아래 경복궁이 내려다보였다. 습관처럼 광화문 교보문고와 그 옆 피맛골 안 음식점을 들락날락했다. 청와대 방향으로는 복개된 삼청동길을 따라 YS가 좋아했다는 ‘삼청동수제비집’과 김치말이 ‘눈나무집’을 자주 찾았다.
그리운 이름들이 있다. 피맛골에 있던 막걸리를 파는 열차집, 전을 파는 함흥집, 족발을 파는 경원집...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내 피맛골 단골집의 추억은 ‘철거 계고장’을 받고 뿌리 채 뽑혀졌다. 한순간에 화산재로 덮여 지하로 묻혔던 폼페이 유적처럼 내 ‘아름다운 시절’은 영원히 사라졌다.
다른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면 한국 불교의 심장인 조계사가 있다. 그리고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국동 로터리와 인사동이었다.
인사동에는 ‘최후의 물건’들이 즐비했다. 사라질 운명을 견뎌낸 이후의 물건들이었다.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지만 먼지를 털어내고 문지르면 빛나기 시작한다. ‘골동품’으로 불렸지만 추억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인사동 옆 한 발 살짝 걸쳐 올라간 건물 ‘낙원상가’였다. 이름이 천국을 연상시키는 낙원상가는 악기 상가로도 유명했다. 드럼이나 기타 등을 보러 갈 때마다 난장이의 막내딸 영희의 줄 끊어진 기타 줄이 생각났다.
그리고 ‘입 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시인 기형도가 숨진 채 발견된 파고다 극장도 ‘낙원상가’에 있었다. 유하 시인이 ‘어느 뛰어난 시인은 아까운 나이에 영영 몸을 떠났고(시 ‘파고다 극장을 지나며’ 中)’라고 노래한 그 극장이다.
*********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 김불이. 40대 후반 117센티미터 난장이 김불이는 ‘행복동’ 무허가 주택에 살았다. 그리고 판잣집 ‘철거 계고장’을 받고 높은 굴뚝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의 가족은 매일 지옥에서 살면서 천국(낙원)을 꿈꾸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을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난장이 가족은 달세계를 꿈꾸었다. “아버지는 달나라에서 천문대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상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 희망은 비정상이다. 그런데도 달나라로 가기 위해 난장이 김불이는 공장 굴뚝에서 까만 쇠공을 쏘아 올렸다.
그래서 그가 늘 달을 그리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굴뚝에서 추락사한 것은 비사실적이다. 잔혹동화 같다. 마치 노벨문학상을 탄 마르케스의 <백년간의 고독>과 같은 환상소설처럼 느껴진다.
소설 문장은 단문으로 수식어 없이 쏟아진다. 목에 걸린 ‘줄 끊어진 기타줄’처럼 참혹하면서도 기묘하고 아름답다. 감정은 철저히 드러나지 않는다. ‘데자뷔(旣視感, 기시감)’다. 어쩌면 지금 ‘헬조선’의 현실, 출구 없는 흙수저의 비극은 40년 전 이 소설에서 이미 본 것 같다.
*********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우리 세대는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을 ‘난쏘공’으로 줄여 불렀다. ‘난쏘공’이 보통명사였다. 읽을 때마다, 표지가 바뀔 때마다 느낌과 이미지가 달라졌지만 난쏘공은 난쏘공이었다.
1978년 출간한 이 소설은 12편의 단편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쓰였다. 하지만 치밀한 구조로 한 권처럼 짜여졌다. 1996년 100쇄, 2017년 300쇄, 초판 발행 39년 만에 300쇄를 기록했다.
올해 출간 40년 주년을 맞은 소설은 ‘살아있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는 것이 ‘고전’이라고 했던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대학 신입생이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 뽑혔다.
작가 조세희는 1985년 산문집 <침묵의 뿌리> 출간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1990년 연재한 장편 <하얀저고리>도 출간하지 않고 30년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올 초 한 신문사의 기자를 만난 그는 “난장이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말했다. ‘난쏘공’뿐이 아니라 아직도 자라지 못한 우리 사회 난장이들에게 전하는 말이었다.
작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제일 어려운 일은 좋은 글을 쓰는 것,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안 쓰는 것, 세 번째로 어려운 일은 침묵이다.”
나는 작가 조세희를 만나고 싶다. 그를 만나 침묵의 이유를 묻고 싶다. 그리고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