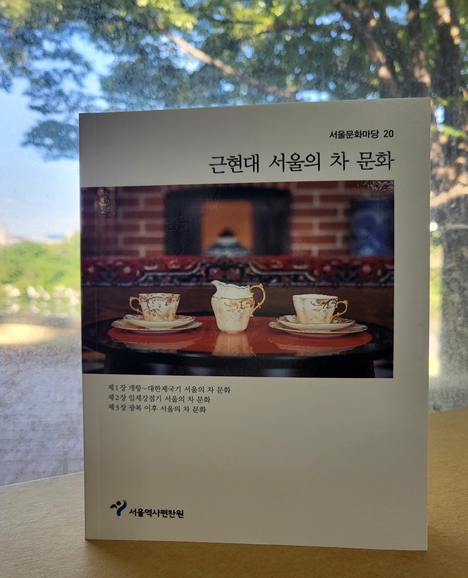[이모작뉴스 김경 기자] 서울에 다방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서울역사편찬원이 발간한 <근현대 서울의 차 문화> 속에 해답이 있다. 개항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차 문화’, ‘음료 문화’,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책이다. 책 속 내용을 따라가 보자.
개항 이후, 서울에 다양한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커피, 홍차 등의 음료들이 소비되기 시작했다. 의학, 교육, 교통·통신 등 서양의 문화를 도입하던 왕실에서는 공적·사적 음료로 ‘작성차’나 ‘백호차’등의 전통차와 함께 홍차와 커피를 즐겨 마시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황실의 접빈연과 원유회(園遊會)의 다과에는 서양식 음료와 간식, 찻잔이 함께 오르기도 했다. 서양인, 일본인,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이던 정동, 진고개, 수표교, 서소문 등은 이들에 의해 커피, 홍차, 사이다 등 새로운 음료들이 유입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서울(당시 경성)은 새로운 공간과 낯선 음료가 빠르게 자리 잡았다. 경성 사람들은 식료품점, 백화점, 박람회장, 카페, 제과점, 극장 등 새로운 소비 공간에서 커피, 홍차는 물론 일본식 녹차, 코코아, 라무네(레모네이드)등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는 ‘끽다점[喫 茶店]’, ‘찻집’, ‘티룸’ 등으로 불리던 다방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경복궁 서측(서촌)과 성북동 일대를 중심으로 ‘차’를 매개로 당대의 정치인, 종교인, 문화예술인들이 시대의 아픔을 논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광복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다방의 전성시대’ 속에서 산업화, 석유파동, 민주화 운동, 복고열풍, 세계화 등 시대적 흐름은 서울의 차 문화 풍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미군정기부터 1970년대까지 널리 확산되던 커피와 홍차는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으로 위축되었다. 이 시기 정부와 시민사회에 ‘국산차 애용 캠페인’이 펼쳐져 커피, 홍차를 대신할 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스턴트 차의 개발과 함께 인삼차, 쌍화차, 곤포차 등의 전통차 소비가 장려되던 시기였다.
1980년대의 차 문화는 민주화를 향한 청년들의 토론의 장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후 ‘수준이 높아진 입맛’에 맞추어 1990년대부터는 커피, 차, 버블티 등 다양한 음료의 ‘전문점’들이 생겨났다.
오늘날은 과거의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레트로(복고)열풍이 불며 옛 시절 다방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학로의 학림다방, 종로의 반쥴, 신촌의 독수리다방 등이 젊은 층에게 다시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 세계 다문화를 만날 수 있는 ‘다문화촌’ 이태원에서는 영국, 터키,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다.
근현대 서울의 차 문화는 단순히 우리의 ‘전통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의 다양한 차 문화, 음료문화가 융합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서울의 차 문화는 마치 ‘세계의 티 테이블’이 모두 모인 듯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