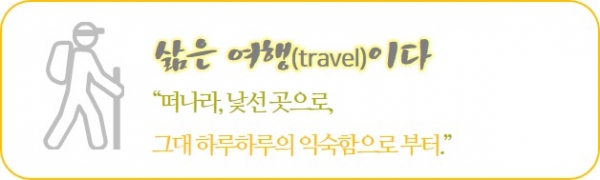
저 돌탑으로 서 있을 일이다
지치지 말고
흰구름 머리 위로
쉴 새 없이 지나가고
그림자 같은 것들
밟지 못하고
꿈을 꾸다가
별빛을 보다가
기다림이란
여름날 소낙비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것
-‘기다림’, 윤재훈

[이모작뉴스 윤재훈 기자] 노고단은 짙은 안개 속에 쌓여있고, 그 뿌연 사이로 연한 철쭉들이 학창시절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머리 긴 아이들의 머리를 기계로 밀어버린 듯, 듬성듬성 피어있다. 지금의 아이들은 상상이나 할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무서워 ‘말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시대이니!’,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들에게 있겠지만 말이다.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은, 오직 상위권 대학과 경제만을 절규처럼 부르짖은, “인문학은 구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취급하며,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 물질만을 숭상하는 동물”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20~30여 분 완만한 계단을 오른다. 애기똥풀꽃을 닮은 노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온 듯이 가라고’,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고’ 온화하게 손짓하는 것 같다. 그 옛날에는 대부분 흙길이었다. 지금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흙을 밟고 오르던 그 부드럽고 따스한 정서를 느낄 수 없다. 아마도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야겠지만, 플라스틱 구조물과 거기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의 오염도 정도는 또 어떨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도 같다.

마침내 보일 듯 말 듯 돌탑이 수줍게 얼굴을 내민다. 어디에선가 노고할미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바라보는 있을 듯하다. 계속해서 연분홍 철쭉들이 얼굴을 내미는데, 아래쪽으로는 안개가 짙어 아예 내려다보이지 않는다. 습기를 머금은 안개가 우리들의 얼굴에 스치듯 지나가고, 둥두렷이 시 한 편이 떠오른다.
이곳이니 저곳이니 분별말게
산이면 산(山), 물이면 물(水)
그대로 두게
하필이면 서녘에만 극락있으랴
흰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
마침내 1,507m 노고단이다. 일행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청년들만 두 명 호젓하게 앉아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나게 하는지, 진지한 표정들이다. 표지판에는 옛 신라화랑들이 이곳에서 수련하면 탑(塔)과 단(壇)을 쌓고 천지신명과 노고할미에게 나라의 번영과 백성을 안녕을 빌었다고 하는데, 어디 그들뿐이었겠는가.
그 옛날 백제나 가야, 삼한 시대에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소박한 기원을 드리며, 강강술래도 돌고 치성을 드렸을 것 아닌가. 그 흔적들이 초석으로 남아 1961년 다시 단을 쌓고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고 한다. 따라서 탑의 원형 보존을 위해서 그 위에 돌을 쌓지 말라고 한다.

군데군데 우뚝 솟은 나무들이 보인다. 구상나무이다. 오래전부터 이곳 노고단은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 나무들이 아주 키가 작거나 한쪽으로만 가지가 뻗어있다. 그런데 구상나무만 마치 키다리처럼 우뚝 솟아 주위를 내려다보고 있다. 주로 이 나무는 지리산이나 한라산, 덕유산 등 해발이 1,000m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늘은 무서워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고 생각하며,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의에 어긋난 짓을 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옷깃을 여몄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조심하며, 공동체를 귀히 여겼다. 그런 전통들이 품앗이가 되고 두레가 되어 우리의 심성에 소중한 유물로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통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오직 속도와 물질만을 추구하는 짐승 같은 어른들로 넘쳐난다. 그래서 사는 계층들마저 차별을 두려고 한다. 마치 그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나, 고려시대처럼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은 그들만의 혼맥으로 계약결혼 같은 혼인을 한다. 여차하면 수십억의 위자료 속에 웃으면서 돌아선다.
짐승 같은 범죄들이 매일 일어나지만, 어른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나쁜 위정자(爲政者)들이 팽배하여 그것을 더욱 부채질한다.
하지만 민초(民草)들은 하늘을 숭상하고 인간과 하늘을 하나로 잇고 싶어 했다. 그런 기구(祈求)들이 돌탑, 솟대, 당산나무 등으로 남아 오늘 우리에게 무언(無言)으로 옛 시절을 증언하고 있다.
저 돌탑으로 서 있을 일이다
지치지 말고
흰구름 머리 위로
쉴 새 없이 지나가고
그림자 같은 것들
밟지 못하고
꿈을 꾸다가
별빛을 보다가
서녘으로 져 가는
별똥별 보며
깻대를 털다가 보낸 여름이
아스라한
기다림이란
여름날 소낙비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것
더러는
봉숭아 꽃물
손톱에 물들이기 같은 것
-‘기다림’, 윤재훈

노고단에서 약 2.1km에 해당하는데 지령으로 들어선다. 이제 여기서부터 1.4km에 해 해당하는 길이 임걸령이며, 거기에서 1km를 가면 마침내 노루목에 도착한다. 숲은 계속해서 너덜길이다. 돌들이 무작위로 제자리를 잡지 못해 울퉁불퉁한 길에 잘못하며 발을 삘 것만 같아 조심스럽다. 초롱꽃을 닮은 연분홍의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향기를 뿜으며, 발길의 피로를 풀어준다. 일행 중에 먼저 간 사람은 쉼터에서 한가하게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망중한(忙中閑)을 즐긴다.
오솔길에 서 있는 이정표를 보니 벌써 노고단을 2.8km를 지나왔다. 이제 천왕봉까지는 22.7km가 남았다. 허기가 몰려온다. 하긴 새벽에 누룽지 한 그릇을 먹고 계속 땀을 흘리며 왔으니 당연한 일이다. 배낭에는 마땅하게 먹을 게 없다. 평소에 입에도 대지 않던 초콜릿과 에너지바를 먹는다. 약간의 허기가 가시는 듯도 하고 다시 힘을 낸다

여기서 남쪽으로 2km 정도 가면 피아골 산장이 나오고, 6km쯤 가면 산간마을인 직전마을이 나온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다. 20여 분 가니 임걸령 쉼터라고 자그마한 샘이 나온다. 작은 돌확(돌절구) 위로 물량이 제법 풍부한데 청소하지 않는지, 주위가 지저분하다. 양은그릇이 세 개 걸려 바람이 불 때면 서로 부딪치며, 풍경소리를 낸다. 잠시 약수 한 모금에 땀을 식히며 바위 위에 무거운 배낭을 던지듯이 내려놓는다.
아, 시원한 지리산 바람!
상쾌하기만 하다.
그대로 신선이 될 것 같다.
온 듯 아니온 듯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산은 그 자리에 묵상하고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은 듯 무념무상(無念無想)이다.
그 산의 정신을 가늠하며
사바(娑婆)의 미진(微塵)툭, 툭, 털고
다시 발걸음에 힘을 준다.

오르막길이 나오기 시작한다. 더 허기가 몰려온다. 드디어 반야봉 팻말이 나온다. 1,732m, 지리산 주능선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봉우리, 대부분 산악인이 오르기가 힘들어, 그냥 지나친다는 곳. 우리 일행들은 삼거리에 배낭을 놓고 오르기로 했다. 오르는 길은 계속해서 연분홍 철쭉들은 연이어 피어있다. 전날 운동을 하고 밤새 달려와 새벽부터 헐떡이며 산을 오르는 나를 위로하듯 속절없이 이어져 있다.
반야봉 전체가 연분홍 꽃밭이다. 눈이 갑자기 호강한다. 30여 분 올라왔을까, 드디어 정상이다. 항상 산은 아래에서는 “그냥 갈까”하고, 정상에 오르면 “포기하지 않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일행들과 느긋하게 산바람을 즐기며 잠깐 누웠는데 깜박, 잠이 들었나 보다. 일행들은 다 내려가고 꽃사진에 취한 여성 한 사람만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내려가는 길에 그녀가 잠시 멈춰 뭔가를 딴다. 가만히 보니 산취나물이다. 나도 함께 딴다. 저녁때 밥과 고기에 싸 먹을 생각을 하니, 허기진 배가 더욱 고파온다. 안개는 아직도 걷히지 않고 봉우리를 두껍게 덮고 있다. 더는 갈 수 없었는지 일행들이 삼거리에 앉아 라면을 끓인다.
“아, 배가 등짝에 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