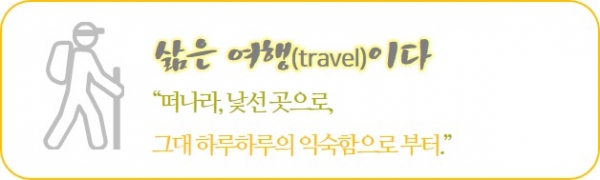
천 년을 여기 서서 기다려볼거나
이제 물밥도 다 말라 날아가고
눈에 익던 앞산들도 자고 나면 아랫도리부터 사라져 간다
휘청거리던 나의 허리에 많은 구름 형상들은 머물다 가고
그 새 마을의 많은 이들도 내 발밑에서 풀꽃들처럼 피었다 졌다
어떤 이들은 내 아래에서 신(神)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내 아래에서 첫사랑을 맺었다
- ‘솟대’, 윤재훈

[이모작뉴스 윤재훈 기자] 아가의 둔부같이 유장하게 뻗어 나간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산세가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다가, 깨다가 빨던, 어머니의 젖가슴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포개고 또 포개져 완만하게 타고 내려가는 지리산의 산세가 그렇다. 멀리서 바라보는 반야봉의 산세가 또 그렇다.
松下問童子(송하문동자)
言師採藥去(언사채약거)
只在此山中(지재차산중)
雲深不知處(운심부지처)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물으니
스승은 약초를 캐러 가셨나이다.
이 산중에 계신 줄은 아나,
안개가 짙어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 못하오이다.
- 尋隱者不遇(심은자불우,은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함), 賈島(가도)(779~843). 중당(中唐) 때의 시인,
날아갈 듯이 치켜 올라간 산사의 처마와 약간은 도도한 옥떨기 같은 여인의 버선코도 한국의 산하를 닮았다. 아스라하게 건너편 산의 능선과 어울리는 지붕의 곡선은 전혀 위압적이지 않고 산의 품에 꼭 안겨있는 듯하다. 무작정 솟아 바람의 길까지 막고 있는 도시의 위압적인 빌딩들이 아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은 또 얼마나 퇴색(退色)적인가, '천 년을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은 가만가만 저 산빛으로 물드는 것이라고 위무하는 것 같다.’ 그 산능선을 타고 풍경소리처럼, 범종 소리처럼, 땡그랑 땡그랑, 노래 한 소절이 그 능선을 타고 넘는 듯하다.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나래 쉬고 보더라
한번 구르니 나무 끝에 아련하고
두 번을 거듭 차니 사바가 발아래라
마음의 일만 근심은 바람이 실어가네
- ‘그네’, 김말봉

1967, 12월 29일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智異山), 나는 특별히 ‘지혜로울 지(智)’ 자를 좋아한다. 나 자신이 늘 지혜가 부족한 것에 대한 목마름에 자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자 안에는 반드시 이 글자를 넣고 싶었다. 지리산(智異山)의 뜻은
“다름을 아는 것,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라고 한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그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백두대간의 맥이 다시 솟은 곳’이라는 뜻으로 두류산(頭流山) ‘지혜가 흐르는’으로 부르거나 도교의 영향을 받다 방장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자만 변경되어 지리산으로 불리는 여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순우리말을 음차한 지명이라 볼 수 있으며, 한자 이름은 뒤에 우리말을 바탕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지명학회는 ‘지루하다’에서 그 뿌리를 찾았다. 하긴 지리산의 능선은 아가의 둔부나 엄마의 젖가슴처럼 둥글고 유장하게 뻗어있으니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 유장함 속에 자리 잡은 옛 우리의 사찰은 산맥에 대해 거슬림이라든가 하는 것 없이 그 산 안에 포근히 안겨있는 느낌이다. 우후죽순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로만 솟아오르는 현대도시의 빌딩들처럼 바람의 길마저 막고 있지 않다.
수많은 식물과 반달가슴곰들이 서식하고 있는 이 산 안에는 화엄사, 대원사, 쌍계사, 천은사 등을 비롯한 고찰들도 많고 지리산 녹차도 많은 사람이 매년 이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소용돌이 속에 한 민족 빨치산들에 대한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산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보물과 국보들도 산재해 있다. 천왕봉 정상에 오르면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된다.”
라는 돌비석이 있다.

가끔 오는 곳이지만 오늘도 지리산을 온 김에 쉬엄쉬엄 옛길을 걷는다. 중앙로터리로 접어드니 양손에 태극기를 든 동산이 하나 보인다. 박경현 선생, 이 자리는 기미 독립 만세 의거 자리로 당시에는 구례시장 터였다. 특히나 동산을 만든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구례 군민 일동’이라는 말에 더욱더 그 의미가 깊다.
1859년 구례 광의면 지상 마을에서 태어난 선생은 1919년 3월 24일 구례 장날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왜병들에게 끌려가 8개월 옥고를 치른다. 그리고 “때려도 좋다, 만만세! 죽어도 좋다, 만만세!”하며 의기를 굽히지 않았으며, 출옥한 후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23년 8월 2일 순절(殉節)한다. 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어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다.
동상 비문의 마지막에는 ‘실로 기품이 높고 뛰어난 추상같은 늠름함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만세 할아버지로 불린다. 선생의 절의와 기품을 흠모하고 기리며 후학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구례 군민의 뜻을 모아 여기 이 빗돌을 새긴다. 2001년 4월 20일 구례군민 일동’이라고 적혀있다. 이외에도 구례군은 ‘구례군민 일동’이라고 적힌 동상과 비석으로 동편제전수관 비석과 연곡사 고광순 의사 순절비 등이 더 있다.

어느 이름 없는 화가의 집이라도 될까, 누추한 초가집에 화려한 색칠을 하였다. 오랫동안 인적은 없어 보인다. 잠깐 노크라도 한번 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만두었다.
인근에 수박과 과일 몇 가지를 팔고 있는 조그만 과일 가게가 있다. 아주머니는 사람 그림자가 없는 한적한 거리에 그만 싫증이 났는지 깊은 잠에 빠져있다.
명산 지리산 아래 자리 잡고 앞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영험한 고장이지만 이곳 시내 곳곳에 빈집이 보인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리고 나이 든 부모만 남아 사는 고향, 시골은 갈수록 더욱 외로운 풍경으로 변해간다. 세월 모르는 까마귀만 긴 울음을 남기고 지리산 쪽으로 날아간다.
1
여기 서서 기다려 볼거나
꼰지발로, 꼰지발로
그러다가 자꾸만 목은 길어지고
날개를 펴고 날지도 못한 채,
지나간 풍상만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천 년을 여기 서서 기다려 볼거나
이제 물밥*도 다 말라 날아가고
눈에 익던 앞산들도 자고 나면 아랫도리부터 사라져 간다
휘청거리던 나의 허리에 많은 구름 형상들은 머물다 가고
그 새 마을의 많은 이들도 내 발밑에서 풀꽃들처럼 피었다 졌다
어떤 이들은 내 아래에서 신(神)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내 아래에서 첫사랑을 맺었다
나를 기댄 매화꽃도 수없이 피었다 지고
내 밑으로 아이들은 도시로 떠났다
어떤 이들은 나의 다리에 못 자국을 내고
어떤 이들은 나에게 큰절하고 갔다
태풍은 나를 안고 혼절하도록 몰아쳐도 든든히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기다렸다
2
정말 떠날 생각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어쩌랴, 떨리는 生을
내 허리까지 물난리가 나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내려가고
온 밤을 해소로 울다가 은하수(銀河水)로 올라가,
반짝반짝 유영하는 친구들도 보인다
앞산의 수목들은 푸른빛으로 쑥쑥쑥쑥 자라나는데
이제 내 친구들은 부러지고, 그들의 머리는 땅에 뒹군다
그러다 별들이 뜨면,
지상에 얹힌 수만 마리의 오리들은 일제히 날아올라 큰곰, 작은 곰, 황소자리, 처녀자리, 오리온…,
수많은 별자리로 오늘 밤 다시 살아온다
- ‘솟대’, 윤재훈
* 물밥은 제사를 지낸 후 밥과 여러 제사상 음식을 조금씩 떼어 물에 말아 대문 밖에 내놓은 것으로, 이는 조상님과 함께 찾아온 다른 혼령들에게 주는 제삿밥이라 한다.

사람을 다 떠나간 고요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왁자한 주막이 펼쳐지고, 돼지고기 숭, 숭, 썰고 있던 주모가 걸쭉한 탁배기 한 잔 따라주며 목이라도 축이라고 할 것 같다. 한 쪽이 내려앉은 채 거미줄만 날리는 빈집을 보면, 어쩐지 눈물이 난다.
지리산, 지리산, 자꾸 입속에서 외우니 푸른 물소리가 난다. 지리산의 높이는 1,915m와 1,916.77m로 혼동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양군청이 2007년에 GPS 측량기로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높이보다 1,77m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높이는 1,915m이다.
백두대간의 끝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의 구례, 전라북도의 남원, 경상남도의 하동, 함양, 산청 등 3개도 5개 시군에 걸쳐 483,022㎢의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산악형 국립공원. 둘레가 320여km나 되는 지리산은 셀 수 없이 많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20여 개의 능선 사이로 계곡들이 자리하고 있다. 약간은 이질적인 문화가 동과 서, 영남과 호남이 서로 만나지만 이 거대한 산은 단순히 ‘넓다, 크다, 깊다’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매력이 있어서인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이 산을 오른다.
최고봉인 천왕봉은 경상남도 산청군과 함양군에 걸쳐 있으며, 두 번째 봉인 1,732m인 반야봉은 전라북도 남원에, 세 번째 봉인 1,507m의 노고단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속한다.
지리산은 북에 있는 백두산을 빼고 내륙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다. 이 거대한 산은 어디 한 군데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리산의 끝과 끝인 ‘화대 종주’를 꿈꾼다. 바로 전남 구례 ‘화엄사(華嚴寺)’에서 경남의 ‘대원사’로 내려가는 가장 긴 코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 첫발은 구례 화엄사이다. 과거에는 성삼재로 출발하는 버스가 없을 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부터 힘들게 구례 화엄사에서 성삼재를 오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룻밤을 구례에서 유숙하고, 다음날 오르기도 했다. 만약 봄에 간다면, 또 여행객은 곡성쯤에서부터 지리산을 싸고도는 섬진강변의 꽃 잔치를 덤으로 볼 수 있다. 혼절할 것 같은 섬진강 10리 벚꽃길에서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입구에는 ‘대화엄성지(大華嚴聖地)’라는 커다란 돌기둥이 위압감으로 다가오고, 잠시 후 ‘시의 동산’이 나타난다. 수많은 시와 조각품들이 나타난다. 그중에 송수권 시인의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누이야
가을 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낱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 드릴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 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낱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 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낱이
지금 이 못 물속에 비쳐 옴을"
-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화엄사 입구에 이르자 사천왕상이 막고 담 위로는 커다란 용의 머리들이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다. 옆에는 단청에 색을 칠하는 화가들이라도 되는 듯 잡상(雜像) 같은 것에 황금색 물감을 올리고 있다. 수행공간으로 들어가는 화엄사 입구에는 인근 마을에서 온 아주머니들이 지리산에서 재취한 마른 산나물이나 특산물 같은 것을 파는 모양인데, 늦은 점심이라도 먹으러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