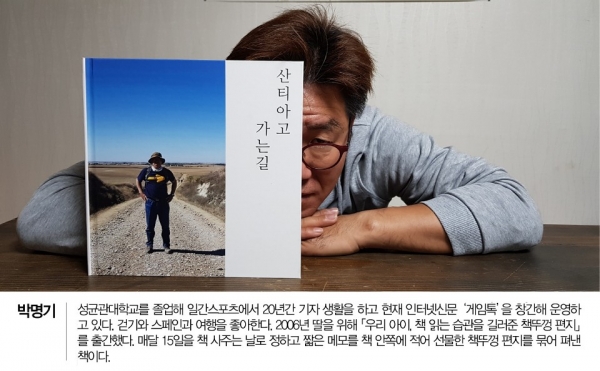“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생활필수품이고 국민증명서다.”
-박낙종 ‘베트남 문화의 길을 걷다’에서

벌써 3월이다. 올해의 시작은 여행으로 출발이었다. 1월과 2월 쿠바와 호치민 두 도시에서 열흘, 나흘씩 보냈다.
나는 두 도시에서 동트는 새벽에 ‘나 홀로 산책’에 나섰다. 아직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쿠바 구 아나바 도심에서 인력거 택시꾼의 출근 모습과 마주쳤다. 오토바이 행렬을 보며 호치민 사이공강에서 고기를 잡는 낚시꾼을 보았다.

생애 첫 베트남 방문지는 호치민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이 도시를 생각하면 수많은 단어들이 스쳐간다. 숙소인 롯데호텔 앞 사이공강과 공사 중인 지하철, 쌀국수와 분짜, 마사지숍,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귀를 웽웽거리는 오토바이 굉음들...
■ 베트남과의 첫 만남, 한국보다 부드럽고 진한 쌀국수
통일 전 사이공으로 불렸던 호치민, 베트남 첫 방문지에서의 첫 식사는 쌀국수였다. 쌀국수는 베트남 음식의 왕이다. 진한 육수와 허브와 소고기와 닭고기를 곁들인 국수였다.
첫 젓가락질부터 흥분이 되었다. 진짜 외국인처럼(?) 조심스레 면을 건져 먹고 국물을 떠먹으며 음미했다. 맛이 참 묘했다. 한국에서 먹던 쌀국수보다 면발이 부드럽다. 향도 진했다.
베트남 말로 ‘퍼(pho)’로 불리는 쌀국수는 원래 하노이 쌀가루 음식이라고 한다. 소뼈를 우려낸 국물, 얇게 썬 쇠고기나 닭뼈를 삶은 국물에 얇게 썬 닭고기로 크게 나뉜다. 첫 시식을 후루룩 먹고 나니 베트남에 와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이후 3박 4일 동안 쌀국수를 하루 한 끼 이상 먹었다. 프랑스식 샌드위치인 분짜도 괜찮았다. 숯불에 구운 완자, 야채를 새콤달콤한 국물에 담갔다 먹는 맛도 현지식이니 더 폼이 났다. 보통 잔 바닥에 연유를 깔고 드립필터로 진한 커피를 내려먹는 베트남식 커피도 맛있었다.
■ “뱃속에서부터 탄다”는 오토바이 천국...한 눈 파는 순간 위험
베트남 그리고 호치민시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는 베트남 전 인구의 절반가량이 넘게 타는 생활필수품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베트남인들은 뱃속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탄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 오토바이 수는 4300만대다. 전체 인구 9400만 명의 60%가 탄다. 가히 ‘오토바이 천국’이다.
역설적으로 베트남인들은 걷는 것을 싫어한다. 거리에도 시내버스가 적었다. 택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호치민의 오토바이는 큰 도로부터 골목길까지 멈추는 법이 없이 질주한다. 실제로 내가 묵은 롯데호텔 창으로 본 출퇴근 길거리 풍경은 놀라웠다. 오토바이들이 개미 행렬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는 외국에 갈 때마다 동이 뜰 때면 빠짐없이 마을을 돈다. 처음에는 조깅족이 뛰어오고, 이어 애완견 산책객이 지나간다. 이어 회사원과 학생들이 영화 필름처럼 이어진다. 호치민 아침 산책길에는 호텔 길 건너 사이공강을 찾았다.
길 하나 차이인데 건널목에 서 있는데 아찔했다. 오토바이 행렬은 끊어지는 법이 없었다. 신호등이 있음에도 길 하나 건너는데 20분 이상 걸렸다. 조심조심 건너서 드디어 성공했다. ‘아 정신을 차려야 살아남는다’는 생각만 스쳤다. ‘한눈을 파는 순간 치인다’는 말이 실감났다.
출퇴근 시간에는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승용차와 뒤섞여 달렸다. 차선 둘 중 하나는 오롯이 오토바이 행렬이 차지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에 너무 붙어서 돌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달렸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1년에 2만4000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잠도, 휴대폰도, SNS(소셜네트워크)도, 데이트도 오토바이에서 한다고 전해 들었다. 실제 그랬다. 현지 가이드는 “휴대폰을 노리는 오토바이치기를 주의하라” “길거리에서 가방은 앞으로 메고 가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기시켰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 어딜 가나 ‘호아저씨’ 초상, 평생 독신...유산은 책 몇 권과 옷 몇 벌
호치민시의 도시 이름인 ‘호치민’은 독립운동의 영웅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호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사람이다. 호아저씨급은 아니지만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국가대표 축구 감독도 ‘박 아저씨’로 불렸다.

호치민 초상은 베트남 어딜 가든 만날 수 있었다. 대부분 집에 걸려 있고, 벽화를 비롯한 동상, 모든 지폐에 그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우체국 벽면에도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는 19세에 조국의 독립을 찾겠다고 결심해 프랑스 유학했다. 55세에 귀국해 일본-프랑스를 향해 평생 독립운동을 전개해 결국 성공시켰다. 그는 베트남 통일을 직접 보지 못하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69년 79세에 숨을 거뒀다.
민족독립과 통일을 위해 평생 독신을 선택한 그가 남긴 재산은 책 몇 권과 옷 몇 벌, 기워 신은 양말,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신발, 낡은 모자뿐이었다. 이 검소한 지도자 앞에서 베트남인들은 언제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보냈다.

호치민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북적이는 곳 중 하나가 전쟁박물관이었다. 야외에는 당당하게 전쟁 때 빼앗은 미군의 무기와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박물관에는 미국과의 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동선이 꾸며졌다. 고엽제로 황폐한 들판, 피해자들의 참혹한 사진들, 투하된 무기와 참전국가 병력 등 ‘절대 안 잊겠다’는 상징 같았다.
■ 호치민, 프랑스 식민지 건물과 첨단 빌딩이 어우러진 도시
폴 서루는 말했다. “고독이 두려우면 여행을 하지 마라.” 최상의 여행은 역시 혼자 감행하는 여행이다. 아쉽게도 동행이 있었지만 ‘일’이 아닌 여행, 호치민 길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느낌에 푹 빠졌다.
베트남 전체가 아닌 호치민은, 완전히 다른 별나라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었다. 사이공강과 메콩강 삼각주 인근 풍경은 아름다웠다. 호치민 시내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성당, 우체국 등 건축물과 아파트와 첨단빌딩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다.

비록 시내 중심을 벗어나면 마치 한국 1980년대 같은 시골이 펼쳐졌지만 매일 화장을 바꾸는 역동적인 도시였다. 시간 여행처럼 농촌 풍경과 사이공 강 주변으로 솟아오른 빌딩처럼 세련된 도시가 뒤섞인 느낌이었다.
베트남 국토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다.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1600km가 되는 긴 나라다. 호치민은 용 꼬리 쪽에 붙어있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금세 익숙해져버리는 친근한 도시였다. 물론 그것도 ‘오토바이 질주’를 빼놓고 하는 말이다.